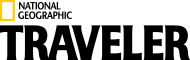“‘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가 있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광경을
포착한 순간.”

하얀 포말로 부서지며 마치 설산 같은 풍경을 빚어낸다.
바다 위 섬이 된 산
나는 지난 3년간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지형을 관찰해왔다. 경상북도 경주의 양남주상절리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던 날, 바위에 부딪친 물결이 하얀 포말로 부서졌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니 운해(雲海)가 생각났다. 일교차가 큰 계절, 이른 아침 높은 산에 올라서 보면 짙은 안개 속에서 봉우리가 마치 바다의 섬처럼 솟아나 있다. 이때의 기상 상태를 운해라고 하며, 구름바다라고도 말한다. 움직이는 파도를 ‘느린 셔터’로 포착해 시간을 농축한 순간, 산이 보이고 운해가 드리웠다. 수묵담채 기법으로 설산을 그린 듯한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 것이다.

태초에 산과 바다는 한 몸이었다. 지각변동을 거치며 높은 곳은 산이 되고, 낮은 곳은 바다가 되었다. 산에서 보는 운해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불면 구름도 파도처럼 물결친다. 오전 7시 남양주 수종사에서 마주한 산봉우리는 섬이 되고, 구름은 바다가 되어 파도처럼 일렁였다.
세상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무늬로 가득 차 있다. 이를 관찰하는 일은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산과 바다는 서로 다른 풍경이지만, 같은 무늬를 지니고 태곳적 근원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연은 사유와 명상의 또 다른 세계이다.

※ 주기중은 전통 산수화의 정신을 사진으로 구현하는 신진경산수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기자로 활동했으며, 저서로는 <산수화로 배우는 풍경사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