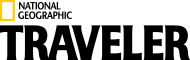배양된 전복이 바다에서 자라 식탁에 요리로 오르고,
그 껍데기는 자개로 재탄생해 나전칠기 공예품이 된다.
자연의 산물이 인간의 손을 거쳐 하나의 작품이 되기까지,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알록달록한 유리잔은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이다. 정확히는 베네치아 본섬에서 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무라노섬에서 왔다. 무라노는 중세 시대부터 유리 공예로 명성이 자자했다. 공방에서 입으로 ‘후’ 불어 유리를 세공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고 홀리듯이 이 유리공예품을 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당장 이탈리아에 갈 순 없지만, 이 베네치아 글라스만으로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당시 여행의 순간이 되살아난다.
이번에는 나전칠기의 고장 통영으로 향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나전칠기를 만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통영 나전칠기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통영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각종 군수품을 자체 조달할 목적으로1 2공방을 만들었다. 임진왜란 이후 통제영이 창성하자1 2공방도 크게 번창하면서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생산하게 된다. 패부방에서 자개를 박고 상하칠방에서 옻칠을 하여 나전칠기 공예품이 완성되었다. 나전칠기의 주재료인 자개는 전통적으로 소라, 전복, 진주조개의 껍데기로 만들었는데, 남해 바다에서 나는 전복이 으뜸이었다고 한다. 여전히 통영의 장인들은 남해에서 자라는 전복 껍데기로 자개를 만들고 나전칠기 공예품을 창작하며 통제영 12공방의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전복의 탄생에서 출발해 현대 나전칠기 예술에 도착하는 여정을 그려보기로 했다.
나전칠기는 25가지 공정으로 제작되며 완성하는 데 적게는 30일, 많게는 1년 이상 걸린다.
전복 껍데기가 자개로 변신

유리장 안에 수많은 소라, 전복, 진주조개 껍데기가 하나의 컬렉션처럼 전시되어 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껍데기가 모두 자개 빛깔이다. 국내산 전복부터 뉴질랜드나 멕시코 등지에서 온 이국적인 전복은 물론 흑진주조개와 다섯 알의 진주가 박혀 있는 것까지 모양과 색깔, 크기가 각양각색이다. 작은 전시장 같은 이곳은 광도면에 위치한 이금동 섭패장의 자택이다. 섭패는 패각을 선별한 후 껍데기를 갈아 무늬와 빛깔이 아름다운 자개를 만드는 과정이다. 현재 통영에서는 이금동 장인만이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다. 내가 다양한 패류 중 궁금한 것을 가리킬 때마다 이금동 장인은 척하면 척 산지와 특징을 읊는다.
지구상에는 약 100여 종의 전복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여섯 종류가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까막전복(둥근전복)은 청패, 참전복(북방전복)은 색패라고 불린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패가 색감이 좋지요. 국내에서는 수온이 따뜻한 제주도에서 청패를 구할 수 있고, 남해 바다에는 색패가 대다수예요. 예로부터 남해에서 나오는 전복 껍데기는 외형에 굴곡이 적고 신비로운 빛을 머금어 나전칠기의 주재료로 쓰였어요. 우리 자개로 만든 나전칠기 공예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손때를 탈수록 빛이 납니다.”

옥탑에 있는 작업실로 자리를 옮겨 장인은 늘 그래왔듯이 여섯 단계의 섭패 공정을 수행한다. 자개가 너무 얇으면 색이 살지 않고 옻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적당한 두께를 감지하려면 손끝의 감각이 중요해 장인은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그래서 지문이 닳는다. 귀가 먹먹해지는 굉음 때문에 청각에 이상이 생겨 보청기에 의존하기도 한다. 전복껍데기를 잘라 반복해서 갈고 광택을 내는 등의 공정을 거쳐 나온 평평한 조각 자개를 ‘알자개’라고 한다. 막 가공한 알자개는 약간 뜨거워서 열을 식히기 위해 물에 씻는다. 장인이 곱고 영롱한 빛깔의 알자개를 두 손에 한가득 담아 보여준다. 마치 바닷속에서 막 꺼낸 것처럼 어떤 생명력이 느껴진다. 우윳빛이나 진주 빛깔을 띤 동양적인 미감이다. 나는 알자개를 하나 들어 여러 각도로 이리저리 살펴본다. 결이 살아있고 오묘한 빛을 발산한다. 이미 내겐 알자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오색찬란한 작품처럼 다가온다. 마무리는 이금동 섭패장의 아내가 맡는다. 알자개를 여럿 모아 붙여 하나의 판 형태인 ‘판자개’를 완성하는 것이다.

2014년 경상남도 최고 장인으로 뽑힌 이금동 선생은 고유한 섭패 공정을 전수받을 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그동안 모은 원패(소라・전복・진주 껍데기의 거친 겉면만 갈아 본연의 모양은 유지한 채 자개 빛깔을 띠는 것)로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인다. 여긴 섭패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자개 가루로 온통 새하얀 세상이다. 알자개 하나를 고이 간직한 채 작업실 문을 여니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버려지는 전복 껍데기가 섭패장 손에 오면 자개가 되고, 나전장 손을 거치면 예술이 된다.
나전화가 된 통영 풍경

조선시대 안견이 그린 산수화 <몽유도원도>를 나전장이 현대로 소환했다. 김종량 장인은 <몽유도원도>를 재해석한 나전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가로 6.7m, 세로 2.44m로 실제 <몽유도원도>의 50배 크기다. 비단에 그린 원작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밑바탕에 모시를 깔았다. 바위의 거친 느낌을 살리려 자개를 가루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원화는 전반적으로 갈색을 띠는데, 이 작품도 햇빛을 받으면 갈색빛이 돈다고 한다.

공예 체험을 위해 통영자개교실 나전칠기체험학습장을 찾았다가 4월 중에 공개될 대작을 미리 엿보게 되었다. 여긴 장인의 공방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16세기 ‘나전칠 모란넝쿨무늬 능화꽃 모양반’과 동일한 작품도 구경할 수 있었다. 이는 김종량 장인의 ‘2012 유물 재현 프로젝트’ 대표작으로 이곳에 있는 건 미완성작이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김종량 장인은 13세 때 나전칠기에 입문했다. 55년 넘게 한길을 걸으며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통영에서 처음으로 나전칠기 공예 체험 수업을 열기도 했다. “작품 작업으로 바쁜 와중이지만, 단 한 명이라도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면 시간을 내려고 해요. 이를 두고 진정한 나전칠기 공예가 아니라는 시선도 있지만, 체험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 나중에 이 길로 들어설지 모르죠. ‘내가 이룬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는 말을 늘 품고 살아요.”

나는 책갈피 체험을 선택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지닌 조각 자개를 핀셋으로 옮겨 맞춰 본다. 도안에 맞도록 자개를 칼로 잘라 통영의 섬과 떠오르는 태양, 주변의 구름을 표현했다. 겨우 자개 몇 조각을 사용했을 뿐인데 쉽지 않다. 하물며 장인 정신이란. 어제 김종량 장인은 작품에 대한 고민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고려시대 나전칠기 공예품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년 이상 길이 남을 작품을 창작하고 싶습니다. 천년 이후의 나전칠기를 상상해보세요.” 장인은 처음엔 취미 삼아 좋아하는 통영의 풍경을 나전화로 작업하다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공방 한쪽에 1950년대 남망산에서 바라본 통영항을 표현한 나전화가 걸려 있다.
디지털 나전쇼

해가 질 무렵 남망산 조각공원에 하나둘 사람이 모이며 줄을 서기 시작한다. 밤이 오면 빛의 정원으로 변하는 남망산의 디피랑을 탐험하기 위해서다. 통영의 유명 벽화골목인 동피랑과 서피랑의 벽화가 2년마다 새롭게 그려지는데, 지워진 그림이 사라지지 않고 밤마다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디피랑이 빛으로 물드는 것이라고 한다(실제로는 다채로운 조명과 특수효과의 힘이지만 말이다). 알록달록 색이 바뀌는 라이트볼을 하나 들고 디피랑 탐험을 떠나본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가면 ‘캠프파이어’, ‘반짝이는 숲’ 등 여러 빛의 축제가 열린다. ‘오래된 동백나무’에서는 나무에 있는 구멍에 라이트볼을 넣으면 마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듯이 고대 동백나무가 빛을 입는다.

‘비밀공방’에서는 나전칠기 공예품의 문양이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며 하나의 아트쇼가 펼쳐진다. 여기서 김종량 장인의 공방에서 본 ‘나전칠 포도 동자무늬 옷상자’를 다시 조우했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물로 재료와 기법 등을 해석할 수 없어 재현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장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연구하여 구현해낸 것인데 디지털로도 되살아났다. 이 나전칠기 공예품은 자연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자개를 깨트려 균열을 만드는 타찰 기법을 사용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문양을 오려 붙이는 기법을 주로 사용해 조금만 금이 가도 결함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나전칠기 표면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존중한다. 포도넝쿨이 자라나듯이 기하학적으로 뻗어 나간다. 천장은 하늘이다. 고개를 드니 별빛이 자개처럼 반짝거린다.

처음 통영에 갈 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0호인 나전장을 우선 뵙고 싶었다. 작년에 송방웅 선생이 별세하셨고, 곧이어 전수 조교인 양옥도 선생도 작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영옻칠미술관에서 송방웅 장인의 작품 ‘목심나전끊음질좌경’ 한 점을 감상할 수 있었고, 송방웅 장인의 스승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나전칠기의 거장인 김봉룡 선생의 ‘무궁화당초문서류함’도 마주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변하고 무언가는 완전히 사라지는 듯하지만, 나전칠기에는 바다가 담겨 있고 장인들의 얼과 혼이 살아 숨 쉰다. 과거의 전통이 미래의 산물로 거듭나고도 있다. 이제 내 곁에는 지갑 속의 알자개, 책에 꽂혀 있는 자개 책갈피, 식사할 때 사용하는 자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다. 찬란한 공예 문화가 꽃피웠다.’ 통영은 흔히 ‘한국의 나폴리’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한국의 베네치아로 기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