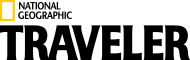그저 서울과 조금 떨어진 외곽 도시인 줄 알았던 수원의 반전 매력을 찾아서.

나의 여행에 동반되는 것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비교적 흔히 찾지 않는 장소를 여행하곤 했다. 아마도 부모님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큰누나와 아프리카 수단에서 3년 정도 살며 미지의 도시를 탐험했다. 나 역시1 8세에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시험을 마치자마자 홀로 이탈리아 사르데냐로 향했다. 도시 내 캠핑장에서 10주 정도 일하며 먹고, 자고, 여행했다.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영국 웨일스에서 런던으로 이사했고 6년을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2년 전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도 나의 여행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남들이 여행지로 꼽지 않는 장소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익숙하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고, 좋아하는 가수가 새로 발표한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에 갔다. 무엇이든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그 주체를 받아들이며 느끼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가본 곳들 중 단 한 곳도 그곳만의 분위기가 없는 곳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처음 수원에 가게 된 계기는 사실 일 때문이었다. 따라서 별다른 기대감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도시 정도로 생각했다. 나와 함께 유튜브 채널 ‘단앤조엘’을 운영하는 조엘 형과 수원에 본사를 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으로 향했다. 찌는 듯한 여름 날씨가 먼저 떠오른다. 초행길이라 헤맨 탓에 1시간이 넘게 지하철을 타고, 택시비로 1만 5000원을 지불하고, 20분을 넘게 걷고 나서야 겨우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퇴근 시간과 딱 맞물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고, 사이클 동호인들의 자전거에 밀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졸았던 기억. 그게, 수원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원
그 후로 딱 1년 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다시 수원을 방문하게 됐다. 당시 우리는 ‘한국 서브 컬처’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시리즈로 ‘한국 롱보더’ 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담을 예정이었다. 그때 함께 촬영을 진행한 롱보더 세 명이 촬영지로 널찍한 경기장(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보유한 수원을 추천했다. 입을 모아 수원이 딱이라고 했다. 그렇게 수원에서 첫 번째 다큐를 촬영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평생의 기억으로 가져갈 만한 의미 있는 장소가 된 셈이다. 거대한 월드컵 경기장, 한국 문화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화성,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수원을 채우는 카테고리다. 그리고 7월 중순, 나는 또다시 수원의 길을 걸었다.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에서 온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곳의 매력을 알리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수원화성부터 시작된 걷기는 행리단길을 따라 쭉 이어졌다. 건물과 자동차 때문에 열기가 더해지는 서울과 달리 수원은 골목 구석구석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비교적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평상시였다면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겠지만, 이상하게도 행리단길에서는 조용히 거닐고 싶었다. 처음 느껴보는 공기와 분위기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 함께 걷고 있는 친구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이 거리는 나에게 생각할 여유를 마련해줬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분주한 서울의 패턴에 익숙한 나에게 행리단길은 마치 차분한 바다처럼 느껴졌다. 재개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장소가 많다. 다행이었다. 수원과의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만남이 정해졌을 때, 내가 살짝 설렌 이유는 이 도시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색 체험거리가 가득한 번화가가 아니라 작지만 내실 있고 아기자기한 가게가 가득한 곳이라는 데 있다. 꼭 저녁 메뉴로 먹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피자 집을 구경하러 행리단길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을 공유하다
길 끝자락에 이르자 일반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계단 근처에 ‘카페 원모어’라고 씌어 있는 글귀가 눈에 띈다. 한잔 더(원모어) 마시고 싶을 만큼 맛있는 곳인가? 조금 더 이동하자 이번엔 정지영커피로스터스라는 곳이 나온다. 빈티지한 느낌의 벽이 마치 개조된 공장이나 창고를 연상시킨다. 심플한 나무 테이블과 옛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했음직한 쇠로 만든 낮은 의자가 보인다. 1층에서 주문을 마치면 지그재그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루프 테라스 등 여러 공간을 구경할 수 있다.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그 바로 옆으로 이어져 있는 화성을 구경할 수 있는 옥상은, 이 카페의 보물 같은 장소다. 나는 여행할 때 항상 근처에 갈 만한 카페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다. 그곳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시간을 몹시 의미있게 여긴다. 카페의 아늑한 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시니,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화성행궁과 팔달문을 지나 남문시장에 도착했다. 길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옛날 성곽과 광장 사이사이로 얼기설기 얽혀 있다. 덕분에 과거의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의 분위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다. 시장보다 한참 높은 화성의 담장 밑으로 드리워진 그림자에는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좌판이 군데군데 벌이면서 마치 수원만의 커뮤니티처럼 보였다. 이런 것이야말로 옛날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골목 따라 고깃집과 순대집이 눈에 띈다. 갓 삶은 돼지머리와 통통한 순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알이 굵고 윤기 나는 포도와 군침이 돌 만큼 빨갛게 익은 수박이 과일 가게의 가판대를 차지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음식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세운 것에서, 메뉴와 식재료에 대한 상인들의 자부심이 엿보인다.
SAY HELLO TO ME
산악자전거를 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쳐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왜유프롬?” “아, 저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영국! 잉글랜드! 나는 아메리카! 유에스 마린코!(US Marine Corps)” 친근한 대화가 오갔다. 어쩐지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편히 안부를 묻게 된다. 시장에서는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등산복과 운동복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가게 앞을 지나다 계획에 없던 낚시용 그물 조끼를 4장이나 샀다. 조끼 하나당 주머니가 10개도 넘는다. 왼쪽 귀 옆으로 날카로운 이쑤시개를 꽂은 사장님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갔다.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유는 뭘까.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수원이 마음에 든다.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때, 나는 그곳에서만이라도 온전한 내가 되고 싶다. 여행지의 명소를 가거나 특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 분주한 나날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일상적인 음식으로 배가 부르다면 만족한다. 생각보다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수원은 서울과 아주 멀지 않음에도, 아주 멀리 온 느낌이었다. 모던하고 힙한 요소들이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적인 문화 역시 충분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내가 온전히 ‘안녕’할 수 있는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