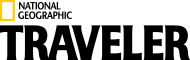“작가 박경리와 박완서는 글을 써내려가는 힘이 ‘증오’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삿갓의 ‘증오’는 수시로 불편한 현실에 맞닥뜨리는 우리를 기절초풍, 포복절도하게 하다가 통렬한 카타르시스로 이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청소년 시절, 지금은 사라진 서울역 뒤쪽의 만리동에 살았다. 만리동은 1980년대에 중림동으로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최만리가 살았던 동네라고 하여 만리고개[萬里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오늘날 세종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것이 한글 창제다. 그런데 이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이가 최만리였기에 그에 대한 일반의 평판은 좋지 않다. 그러나 최만리는 명망 있는 정치가이자 집현전에서도 활동했던 학자로서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오랫동안 그의 이름을 기렸던 만리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동되었으니 최만리도 잊혀지려나?
강원도 영월에는 김병연(蘭皐 金炳淵)의 별명을 딴 김삿갓면이 있다. 그는 평생 삿갓을 쓰고 다녀 김삿갓이나 김립(金笠)으로 더 알려져 있다. 김삿갓면은 영월의 하동면이 변경된 것인데, 이 동네에는 김삿갓이 들어간 상호가 많다. 그의 유적지는 김삿갓면 와석리 노루목에 있다. 산세의 모습이 노루가 엎드려 있는 듯하다고 해서 노루목이라고 한다. 이곳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곳이자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강원 영월이 만나는 접경 지역이다. 잠깐 만에 경상도와 충청도와 강원도를 넘나들 수 있다. 수려한 고산준령 속에 청운의 푸른 꿈을 접고 해학과 풍자, 은일로 한 세상을 살다 간 떠돌이 시인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김삿갓의 묘소와 주거지, 전시관이 있다.
실재했던 인물이지만, 기록이 많지 않아 사실과 구전 사이를 넘나드는 김삿갓의 유명세는 전국에 3곳의 유적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가 태어난 경기 양주, 말년을 보낸 전남 화순, 그리고 묘소가 있는 영월이다. 그의 묘 역시 별 기록 없이 100여 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지만1 982년 향토사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묘의 주인이 밝혀지면서 학계는 물론 소설가 정비석도 이곳을 자주 찾았고 언론에서도 회자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러자 화순 쪽에서 난리가 났다. “김삿갓이 화순에서 죽었는데 묘가 왜 거기서 나와?” 양측 간의 공방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마침내 ‘영월의 묘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후 유적지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김삿갓이 화순에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후 그의 묘가 영월로 이장되었다.

유희의 시대
김삿갓이 활동하던 때의 조선은 기존의 성리학 이념에 맞서 북학, 천주학 등 신사조가 유입되면서 선진문명을 적극 수용하였다. 사회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시기다. 더불어 문예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혁신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영조 때의 이용휴(惠寰 李用休)는 박지원(燕巖 朴趾源)과 쌍벽을 이루던 문단의 거목이었다. 그는 시문의 운율에도관심을 두었는데, 정자를 표현한 시에서 漁, 江, 波, 潮, 汀, 渚 등 삼수변( 氵)이 들어간 글자 십여 개 이상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한자의 뜻을 활용한 문자 유희를 통해 독특한 문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리듬감까지 표현했다.
김홍도(檀園 金弘道)의 그림에서도 리듬감을 맛볼 수 있다. 전통 회화는 그림과 글씨의 조합인데, 이 글씨를 발문이라 한다. 때로는 발문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반복적으로 문장 중간의 특정한 위치에 있는 글자를 좀 더 크게 써서 글자들 간에 강약을 준다. 글자들이 리듬감을 가지면서도 전체 그림의 질서와 적절하게 조응한다.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져 만드는 운율에서 짜릿한 시각적 쾌감을 맛볼 수 있다.
학자이자 서예가로 잘 알려진 김정희(秋史 金正喜) 역시 평생의 수련과 연찬을 통해 과거의 고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 글자의 뜻에 어울리도록 글씨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의 조형 정신은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입고출신(入古出新)·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혁신과 파격성으로 귀결된다.
펀(Pun)이란 은유의 한 형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한 사물에 다른 사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중의성)’이라고 했고, 칸트는 은유 능력을 창조적인 표현력이라 했다. 이로써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상상력이나 은유를 창의적 활동의 척도로 인식했다.
혜환은 1708년생, 단원은 1745년생, 추사는 1786년생, 삿갓은 1807년생이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100여 년에 걸쳐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시대정신과 조형 문법은 거의 동시대적 정서와 감성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 보이는 문예적 기교, 창발적인 특성은 대체로 해학이나 풍자와 연결되는 유희다.

한바탕 시로 놀다
떠돌이 김삿갓도 간혹 시문을 애호하는 사람을 만나는 행운이 있었을 게다. 제대로 한 상 대접도 받았겠지. 한잔 걸치고 나니 합석한 기생에게 연정이 일었던 듯하다.
可憐妓生(가련기생):
가련한 기생
可憐行色可憐身(가련행색가련신):
가련한 행색의 가련한 몸
可憐門前訪可憐(가련문전방가련):
가련의 문 앞에서 가련을 찾네.
可憐此意傳可憐(가련차의전가련):
가련한 이 뜻을 가련에게 전해주면
可憐能知可憐心(가련능지가련심):
가련은 가련한 마음 알아줄 거야.
이 시는 ‘가련’으로 시작해서 각 절구마다 ‘가련’이 후렴구처럼 들어가 있다. 형용사 ‘가련하다’와 기생 이름 ‘가련’이다. ‘가련’이 이름인 것을 모르면 시가 난해하다. ‘가련’이 네 번은 형용사로 네 번은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 반복되는 ‘가련’, 그 가련한 울림에서 기생 가련에 투영된 김삿갓의 가련함이 느껴진다. 기생까지 대동한 술자리야 가물에 콩 나듯 했을 테고 대개는 걸식이다. 어느 부잣집에서 쉰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분노가 치밀었다.
二十樹下(이십수하):
이씹~ 놈 아
二十樹下三十客(이십수하삼십객):
스무 나무 아래에서 서러운 나그네가
四十家中五十食(사십가중오십식):
망할 집에서 상한 밥을 얻어먹으니
人間豈有七十事(인간기유칠십사):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不如家歸三十食(불여가귀삼십식):
집에 돌아가 설은 밥 먹느니만 못하네.
시로 욕을 한바탕 던졌다. 이십, 삼심, 사십, 오십, 칠십은 우리말로 스물, 서른, 마흔, 쉰, 일흔이다. 한자 뜻과 한글 소리를 섞어가며 읽어야 제맛이다. 아울러 첫 행의 ‘이십수하’는 이씹(이십) 놈(나무) 아(하)로 읽어야 한다. 조선 중기, 남인의 영수였던 허목(眉叟 許穆)이 정적이었던 노론의 영수 송시열(尤庵 宋時烈)을 찾아 화양동서원까지 먼 길을 왔지만, 문전박대 당한 뒤 시 한 수를 남기고 떠났다.
步之華陽洞(보지화양동):
걸어서 화양동까지 왔건만
不謁宋先生(불알송선생):
송 선생님을 만나뵙지 못했네.
김삿갓이 어느 서당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밥을 얻어 먹고자 근처에 있던 애를 시켜 허락을 구하러 보냈는데, 훈장은 얼굴도 안 보이고 문전박대당했다. 김삿갓이 허목의 시를 차용해 한 수 써놓고 떠났다.
書堂乃早知(서당내조지):
서당인 줄은 일찌감치 알았지만
房中皆尊物(방중개존물):
방 안에는 모두 귀한 분들뿐이네.
生徒諸未十(생도제미십):
생도는 모두 열 명도 못 되는데
先生來不謁(선생내불알):
선생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나.
소리 내어 읽으면 지독한 욕설이다. 나름 먹물 좀 먹었다는 김삿갓이 역시 먹물 좀 먹었을 시골 서당 훈장의 푸대접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또 어느 날,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만난 머슴에게도 경멸을 당했다. 이 또한 가차없이 응징한다.
腰下佩 ㄱ(요하패 기역):
허리 아래에 낫(ㄱ)을 차고
牛鼻穿 ㅇ(우비천 이응):
소코에는 코뚜레(ㅇ)를 뚫었네.
歸家修 ㄹ(귀가수 리을):
집에 가서 자기(ㄹ)를 닦으라.
不然点 ㄷ(불연점 디귿):
안 그러면 디귿(ㄷ)에 점 찍히리라.
한글 자소를 응용한 것인데, 가공할 순발력이다. ‘기역’은 생긴 모양대로 낫을 가리키고 ‘이응’은 둥그런 소코뚜레를 말한다. ‘리을’은 한자인 몸 ‘기(己)’를 나타내고 ‘디귿’에 점을 찍으면 ‘죽을 망(亡)’이 된다. “허리에 낫을 차고, 소코에 코뚜레를 뚫었구나. 집에 돌아가 자신을 잘 수양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는 전통적 한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글자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합해서 기발한 시를 짓는가 하면 정형시로서의 규칙도 무시한다. 정통 한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발음과 운율 등을 민중들의 기호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환했다. 그의 시는 기존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체를 선보임으로써 조선 후기의 한문학과 한국문학사에 괄목한 만한 이정표를 남겼다.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의 속내를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 그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한자와 한글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김삿갓의 파격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강호를 떠도는 협객은 칼을 품고 다닌다. 산천을 주유하던 김삼갓, 문장을 품은 문협(文俠)이다.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 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가는 객이 누구냐
열두 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 1955년 김문응이 작사한 <방랑시인 김삿갓>
※박현택은 홍익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했으며, 현재 연필뮤지엄 관장이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