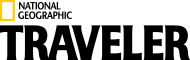산과 물을 통해
천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天下之形勢視乎山川)
산은 본디 하나의 뿌리로부터
수없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山主分而脈本同)
물은 본디 다른 근원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水主合而源各異)
- 동여도(東輿圖) 목판에 부기

문경
조선시대 한양에서 남동쪽 경상도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인 영남대로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소백산맥에 가로막혀 있다. 아니, 산세야 본래 제 모습대로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길과 고개를 낸 것일 뿐. 그 대표적인 고개가 죽령, 조령, 추풍령이다. 예로부터 문경은 충주와 더불어 인후지지(咽喉之地)로 불렸는데, 충주는 한강 유역으로, 문경은 낙동강 유역으로 들어가는 들머리, 즉 ‘목구멍’ 같은 땅이었다.
늦가을의 문경새재 길, 영남대로의 한 구역이다. 영남 제1관문(주흘관), 제2관문(조곡관)을 거쳐 제3관문(조령관)까지는 편도 6~7km 정도로 오전에 출발하면 저녁때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다. 흙과 왕모래가 덮여 있는 5~6m 폭의 완만한 오르막길이다. 소백산맥의 조령산 마루에 설치되어 있는 마지막 관문인 조령관을 지나면 행정구역이 충북 괴산군으로 바뀐다. 이 세 개의 문을 일컬어 ‘문경 조령 관문’이라고 한다. 길 위에 문을 세운 것은 군사적 목적 때문이다. 지형이 험한 이 지역을 산성으로 요새화하고 주흘관은 남쪽을, 조령관은 북쪽을 방위하기 위한 초소이자 통문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왜호양란 이후에 설치되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선조 때 조곡관이 만들어졌고, 이후 숙종대에 와서 주흘관과 조령관이 세워졌다.
새재는 ‘새도 쉬어 가는 고개’라 하여 흔히 조령(鳥嶺)으로 알고 있지만, 새로 생긴 고개라는 뜻도 있다. 그렇다면 헌 고개, 옛 고개도 있었단 말인가? 문헌에 따르면 신라가 북방으로 진출하는 길목이 계립령(하늘재로 이름이 바뀐)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헌 고개이고 이를 대신한 새 고개가 새재라 한다. 또한 사이라는 뜻도 있는데, 새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늘재와 이우릿재(이화령)가 있어 두 고개 사이에 자리한 고개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전한다. 영남(嶺南)이란 바로 이 고개의 남쪽을 말한다. 영남대로는 군사적 목적은 물론 한양과 영남의 교통과 통신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였으며 그 분수령이 새재였다.
이 새재 길에는 여러 역사 유적과 이야기가 얽혀 있지만,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관점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예나 지금이나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다채롭고 흥미롭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추풍령이나 문경새재, 죽령을 넘어야 하지만 시험 치러 가는 선비들은 유독 문경새재를 고집했다. 문경(聞慶)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까닭이다. 반면, 죽령을 넘으면 시험에 ‘죽죽 미끄러지고’,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여겼다. 요즘에도 시험 날엔 미끄러질까 봐 미역국을 먹지 않으며, 척척 붙으라고 끈적끈적한 엿이나 떡을 선물하지 않는가. 또한 새재는 관방시설로 인해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 과거 길에 도적의 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다.
새재
새재 초입에 ‘길’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박물관 문경새재도립공원 옛길박물관이 있다. 현충사나 독립기념관, 광화문처럼 콘크리트로 전통 건축을 흉내 내 지은 건물이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풍부한 전시품과 콘텐츠로 인해 옛길에 대한 충분한 예습이 가능하다. 백두대간과 여러 고개, 전국의 대로와 역참 제도에서부터 지도와 나침반, 먹과 붓, 표주박 등으로 꾸린 괴나리봇짐에 이르기까지 전시와 설명이 흥미롭고 깊이 있다.
본래 새재는 유람 차 찾아가는 곳은 아니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지나쳐 가는 곳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새재 길에서 만나는 산천의 모습은 철철이 아름답고 높은 고개라 단숨에 넘을 수는 없으니 휴식도 필요했을 터이다. 그렇게 쉬면서 감상하게 된 자연과 샘솟는 흥취를 기록해둔 문장이 많이 남아 있다. 경사를 기약하며 1839년 4월 문경새재를 넘은 어떤 선비의 글은 지금 보아도 마음이 아프다. “선비가 비록 과거에 낙방했다 하더라도 슬픈 마음이야 가질 수 없지 않은가.” 그로부터 5년 후인 1844년 11월의 기록도 있다. “나는 급제하지 못했다.” 그는 선비로서의 자존심은 지키려 했지만 끝내 경사스러운 소식은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새재 길은 정문이라 할 주흘관에서부터 시작된다. 발바닥을 통해 적당한 긴장감이 전해지는 부드럽고 헐렁한 흙길이다. 땅의 촉감을 더욱 온전히 느껴보려는 이들이 맨발로 걷기도 한다. 초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관리들이나 여행객들이 이용하던 역관(驛館)과 주막 등이 복원되어 있다. 그러나 도립공원 구역이다 보니 지금의 방문객들을 위한 이렇다 할 식당이나 숙소는 없다. 간단히 요기할 만한 곳이 두어 군데 있기는 하다. 10여 년 전쯤 사업 차 문경에 들어왔던 한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한 뒤 새재 길의 풍광에 반해 조곡관 인근에서 소박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음료수나 파전, 도토리묵, 컵라면 정도지만 맛도 있고 운치도 그만이다.
주흘관과 조곡관의 중간쯤에 이르렀을까.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수백 년 묵은 구렁이처럼 허리를 비틀고 서 있다. 그 옆으로 교귀정(交龜亭)이라는 정자가 보인다. 귀(龜)란 거북의 형상으로 장식된 도장을 뜻하는데, 이곳에서 새로 부임한 신임 경상 감사와 전임 감사가 업무와 관인을 인수인계하였다. 길 옆으로 흐르는 내에는 풍광이 빼어난용 추폭포(용담이라고도 한다)와 펑퍼짐한 너럭바위가 있다. 드라마〈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왕건과 술잔을 나눈 뒤 칼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옛길
최근 ‘둘레길 걷기’, ‘트레킹’ 등 걷기 열풍에 힘입어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중간 중간 옛길의 흔적이 더러 남아 있지만, 지금 걷는 문경새재 길은 먼 옛날의 그 길은 아니다. 1970년대 말, 새재 구역의 옛길을 정비하고 포장하겠다는 계획이 건의되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새재 안에 버스나 승용차를 출입시키면 보존 관리가 어려울 것이니 관문 밖을 포장하여 그 주변에 주차하도록 하고,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새재 구역이란 주흘관부터 조령관까지를 말한다. 이후 이곳은 포장되진 않았지만 단정하게 다듬어진 황톳길이 되었고 문화유적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종종 옛길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눈에 띈다. 안내판을 따라 들어서면 말 그대로 나무숲과 풀이 우거진 옛길의 잔편들이 보인다. 마침 저만치에 커다란 너럭바위가 보여 쉬어 가기로 했다. 가로세로8~10m는 됨 직한 엄청난 크기의 바윗덩이에 앉아 땀을 식혔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던 어느 선비도 이곳에 앉아 봇짐을 풀고 숨을 돌렸을 것이다.
영남대로는 대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리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나무숲과 풀, 돌뿐인 황무지가 사람과 우마차의 왕래로만 다져졌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옛 영남대로의 길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새재 남쪽 진남교반에 있는 토끼비리로 가면 된다. 1800여 년 동안 사람의 발길에 닳고 닳아 바윗길이 반들반들해진 곳도 있다. 지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깥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만 한국의 ‘차마고도’로 일컬어지는 이 길은 강물이 끼고 도는 산자락 사면을 깎아 만든 절벽 길로 겨우 한두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좁고 구불구불하다. 〈문경 옛길〉이라는 시의 구절에서 토끼비리를 연상해볼 수 있다. “가파른 벼랑 위에 길이 겨우 있다. … 얼마나 오래 발소리가 쌓여야 발자국이 되고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쌓여야 조붓한 길이 되는지.”
영남대로 중 가장 험한 이 구간은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진군 시 이곳에서 길이 없어졌는데, 마침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길을 열어주었다(兎遷)’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비리’란 ‘벼루’의 문경 사투리로 낭떠러지 아래 강이 흐르거나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을 일컫는 것으로 벼랑과는 구별된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절벽 아래 강물과 맞은편 마을의 절경에 감동할 수 있지만, 좁은 절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현기증이 일 정도로 높고 험하다.
스스로의 길
길은 산과 물의 흐름을 따른다. 산을 지나면 뒤이어 물을 만나고, 물을 지난 뒤에는 또다시 산을 만난다. 길이 산을 맞닥뜨리면 고개가 되고, 물을 맞닥뜨리면 나루가 된다.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는 곳이다. 또한 일이나 사건의 중요한 고비도 고개라 한다. 길이든 세상살이든 늘 고개와 나루가 있다.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스스로 길이 되어야 한다. 시인 류시화가 자신의 글에 붓다의 말을 인용했다. 붓다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묻는 제자에게 말했다. “어떤 길을 가든 그 길과 하나가 되라.”
길은 ‘사이’이기도 하다. 사이가 이어져 처음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길이라는 것은 무수한 사이로 이루어져 있다. 문경새재는 단순히 고개만이 아닌, 길만이 아닌, 고개와 길을 포괄하는, 경계와 소통의 공간이다. 새재 길을 걸으면 돌 틈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발밑으로 자박자박 밟히는 흙 알갱이 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한층 은밀하게 해준다. 경쾌하게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씻고, 청량한 나뭇잎에 눈을 씻고, 서늘한 바람에 마음을 씻는다. 정적은 문명이 침범하지 않은 침묵의 자연 상태다. 이곳에서는 문명과의 경계, 자연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정적과 침묵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 박현택은 홍익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했으며, 현재 연필뮤지엄 관장이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