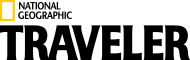“저렇게 많은 중에서
…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이산 김광섭(怡山 金珖燮)의 <저녁에>에서

내 친구 환기
중학생 시절에는 등교 시 걸핏하면 걸어 다녔다. 숙명여대가 있는 청파동에서 한남대교 근처의 보광동까지. 노선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기다렸다 올라탄 버스에서도 시루 속의 콩나물처럼 휘달리니 웬만하면 걷기를 택했던 것이다. 도대체 그 버스는 왜 그리도 배차 간격이 길었던 것인지. 덕분에 차비야 굳었지만.
하교 때는 피곤한 탓에 버스를 탔는데, 아직 회수권이 남아 있을 때라야 가능했다. 회수권은 교문 앞 구멍가게에서는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걸로 국화빵도, 번데기도, 쥐포도 살 수 있었다. 군것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제력은 고등학생쯤 되어서야 가능했다. 어느 날, 점심 도시락 대신 빵을 사 먹었는데 이 빵이 사달이었다. 식중독이었던 듯 싸하게 배가 아프고 계속 토하면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데, 하교 시간까지도 나아지질 않았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하필 회수권도 떨어져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우리 반 반장 김환기가 내게 다가와 부축을 하면서 택시를 잡아주겠단다. 15원짜리 회수권도 없는 판에 택시비가 어디 있냐고? 구차한 사정을 얘기하고 교문 밖을 향해 비실비실 걸어가는데, 얼마 후 스쿨버스로 등하교 하던 환기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헐레벌떡 뛰어왔다. “현택아~ 내가 기사 아저씨한테 말씀드렸거든. 아저씨가 너 태워줘도 된대. 같이 타고 가다가 효창공원 앞에 내려서 걸어가.”
얼굴이 하얗고 넓적한 환기는 떡판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야~ 떡판!” 하고 불러도 싱긋이 웃었다. 스쿨버스를 태워줬던 환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까? 떡판 환기에 대한 기억으로 수화 김환기(樹話 金煥基)의 그림이 더욱 좋아졌고, 김환기의 그림을 마주할 때면 중학생 시절의 친구였던 환기에 대한 기억도 환기된다.

상허 이태준과 근원 김용준
상허(尙虛 李泰俊)와 근원(近園 金瑢俊)은 동갑으로 1926년 도쿄 유학 시절부터 교우했다. 넉넉한 집안 출신의 근원은 당시 명문인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했다. 반면 상허는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덟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어찌어찌 도쿄로 유학은 왔지만 집도 절도 없는 처지라 근원의 하숙방에서 신세를 졌다. 그즈음 궁핍과 고독감에 찌든 친구 상허를 위해 근원이 그려준 <이태준의 초상화>가 지금껏 남아 있다. 딱딱한 종이에 엉성한 천을 씌워 캔버스처럼 만든 바탕에, 눈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상허의 모습이다. 젊은 작가의 우울과 몽상도 함께.
상허는 귀국 후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는데, 꽤나 별난 인물이었던 이상(李箱 金海卿)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게 시를 쓰라고 권유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가 <오감도(烏瞰圖)>다. 시인이자 화가였던 이상은 스물여섯 살 때 스무 살의 변동림과 결혼했지만 반년도 안 돼 일본에서 숨을 거뒀다. 혼자된 변동림은 스물여덟 살에 수화 김환기를 만나 재혼하면서 김향안으로 개명하고 60년을 더 살았다.
단편소설로 유명해져 한국의 모파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상허는 소설만이 아니라 잡문도 잘 썼다. <무서록(無書錄)>, 머리말도 후기도 없이 되는 대로 모아놓은 글이니 수필집이다. 그는 <문장강화(文章講話)>에서 수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수필은 자기의 심적 나체(心的裸體)다. 그러니까 수필을 쓰려면 먼저 ‘자기 풍부’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근원도 화가이자 평론가였지만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를 통해 수필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근원수필>의 후기에서 제 나름의 수필론을 언급했다. “수필이란 글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글인 성싶다. (중략)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맛본 뒤에 저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글이고서야 수필다운 수필이 될 텐데….”
상허의 <무서록>과 근원의 <근원수필>은 우리나라 현대수필의 시금석으로 꼽힌다. 학문적 성취만을 중시하며 잡문(수필)은 쓰지 않겠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작가라는 호칭을 탐해 잡문이라도 쓰려는 이도 있다. 쓰지 않겠다는 이들이나 쓰겠다는 이들 모두 먼저 상허와 근원을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1933년, 상허는 서울 변두리였던 성북동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 이름 붙였다(지금은 찻집으로 운영 중이다). 이듬해 근원도 상허를 따라 성북동으로 들어와 집을 지었는데 70~80년 된 늙은 감나무 몇 그루가 있다 하여 노시산방(老柿山房)이라 했다. 이 택호는 상허가 지었다. 친구 따라 강남(江南) 간다더니, 친구 따라 성북(城北)으로 간 것이다.
수연산방에서 노시산방까지 가려면 개울 길을 따라 언덕배기로 꽤 올라가야 한다. 세월이 흘러 개울은 아스팔트 도로로 복개되었고, 언덕 위쪽에는 절이, 또 한쪽에는 고급 빌라가 들어섰다. 그때의 감나무가 아직 살아 있다면 족히 160여 년이 되었을 것이다. 그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2년 가을, 지금도 붉은 감이 열리는 감나무가 서 있다.

현재 찻집으로 운영 중인 수연산방의 모습.
수연산방 앞에 선 이태준. (유족제공)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
근원은 자신보다 10여 년 연하인 수화와도 교분이 깊었다. 근원이 노시산방에 산 지 몇 년 후, 갓 결혼한 수화와 향안은 살림집이 필요했다. 근원은 수화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넘기면서 화초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의정부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노시산방이 수향산방(樹鄕山房, 樹話와 鄕岸의 첫 자를 딴)으로 바뀌었다. 이 택호는 근원이 지어준 게 아닐까 싶다. 그 후 어느 날 서울에 올라온 근원에게 수화가 “노시산방을 4만원에 팔라는 작자가 생기고 보니 근원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난다”고 했다.
근원은 <육장후기(鬻莊後記)>에서 “수화는 예술에 사는 사람이다. 예술에 산다는 간판을 건 사람이 아니요,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노시산방이 지금쯤은 백만원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천만원, 억만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노시산방은 환영에 불과하다. 노시산방이란 한 덩어리 환영을 인연 삼아 까부라져가는 예술심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했다. 과연 근원은 대단한 혜안의 소유자였다. 그의 말대로 오늘날 수화는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가 되었다. 물론 노시산방(수향산방)이 있던 곳의 집값도 수억원이 훌쩍 넘어간다.
김향안이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에서 쓴 수향산방의 모습이다.
“성북동 32-3, 근원 선생이 취미를 살려서 손수 운치 있게 꾸미신 한옥. 안방, 대청, 건넌방, 안방으로 붙은 부엌, 아랫방, 광으로 된 단순한 기역자 집.(중략) 이백 평 남짓 되는 양지바른 산마루에 집에 붙은 개울이 있고, 여러 그루의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는 후원과 앞마당엔 괴석을 배치해서 풍란을 꽃피게 하며….” 1) 김향안,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근원은 상허의 초상과 <무서록>의 표지화를 그려준 적이 있지만 수화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수향산방전경(樹鄕山房全景)>과 <수화소노인가부좌상(樹話少老人跏趺坐像)>은 이 집과 집주인의 모습이다. 근원은 자신의 호 ‘近園’에 대해 지인들이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꼽혔던 삼원(檀園, 蕙園, 吾園)과 어깨를 겨루고자 園 자를 넣어만든 거 아니냐며 놀려댄다고 했는데,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현재 수향산방은 기념 전시관의 명칭으로 성북동이 아닌 부암동의 환기미술관 내에 있다. 김향안은 옛 추억이 어린 성북동에 환기미술관을 지으려 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1940~50년대 성북동의 정취는 이미 사라졌고 미술관이 들어설 만한 마땅한 땅도 없었다. 같은 북악산 자락이자 성북동의 옛 모습과 가장 닮은 곳을 찾다 보니 현재 위치가 되었다고 한다. 상허와 근원이 살았고 이후 자신들도 살았던 성북동에 대한 그리움이 부암동에 남겨져 있다.
수화 김환기와 이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중략)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교과서에도 실린 이산의 시 <성북동 비둘기>의 첫 구절이다. 상허, 근원과 동년배인 이산은 1960년대 초반 수향산방 옆 개울을 따라 한참 내려간 아래쪽 언덕배기에서 살았다. 이 시는 도시화・산업화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비주류의 애환을 쫓기는 비둘기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이산은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는데 성북동에 살던 수화와도 가까웠다. 수화는 막역한 사이였던 근원과 상허가 한국동란으로 월북한 이후 지음(知音)을 잃은 허허로움에 이산에게 애정이 깊어졌을 것이다.
수화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 이산은 자신이 운영하던 문학지의 경영난으로 인해 골병이 들었다. 이산은 자신의 시집 <성북동 비둘기>를 수화에게 보냈는데, 수화는 여기에 수록된 시에 감명받아 그림을 그렸다. 김향안은 1995년 출판된 김환기의 수필집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수화의 일기에 기록되었듯이 1970년 뉴욕 아틀리에에서 이산의 시 <저녁에>를 마음속에 읊으면서 그린 그림의 제목이며 내용이다”라는 부침 글을 남겼다.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로 시작하는 유심초의 노랫말이 이 시다.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처럼 수많은 색 점들을 찍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김환기의 <16-IV-70 #166, 1970, 코튼에 유채, 236×172cm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연작)>은 작가의 뉴욕 시절 점화 중 대표작으로 1970년 한국일보가 새롭게 창설한 현대미술전인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16-IV-70 #166’은 1970년 4월 16일에 그렸으며 뉴욕에 정착한 후 166번째로 완성한 그림이라는 뜻이다.
수화는 “내가 찍은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 2)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이라고 했다. 너른 캔버스에 점을 찍으니 푸른 파도와 밝은 별빛이 화면 속에 투사된다. 야경의 불빛인지, 고향의 넘실대는 바다인지, 보고 싶은 친구들의 얼굴인지. 점을 한 번만 찍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찍어 평면임에도 두툼하게 느껴진다. 점이 마치 먹처럼 번져나가게 표현되어 동양의 정서를 서양 추상화에 도입했다는 평을 듣는다.
별이 되어 다시 만나리
이산 김광섭은 1905년생, 수화 김환기는 1913년생, 근원 김용준과 상허 이태준은 1904년생이다. 이들의 나이 차이는 10여 년에 이른다. 이들에게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둘은 문인이고 둘은 화가다. 문인은 글로, 화가는 그림으로 사람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그들 모두 서로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저 별들 하나하나에 머물며 반짝인다. 수화는 “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했는데, 사람은 가고 추억은 남아 성북동을 비추는 별들이 되었다.
※ 박현택은 홍익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했으며, 현재 연필뮤지엄 관장이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